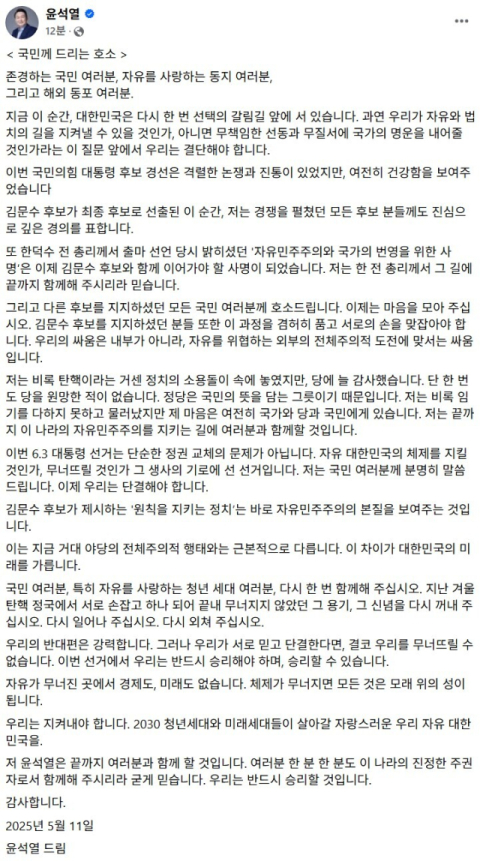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05.13 (화)- 1마을버스 하차하던 20대, 바퀴에 깔려 숨져…버스 기사 입건
- 2"바다 야구장, 북항의 랜드마크로"…부산 동구, 대선 공약 1호 과제 추진
- 3방파제 빠진 아내 구하려다 남편도 추락… 60대 부부 40분 만에 구조
- 440대 연인 살해 뒤…"내가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20대 남성
- 5'후보 회복' 김문수 "즉시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한덕수 함께 해달라"
- 6현역 17명 중 4명만 참석… 부산 국힘 선대위 출범식 ‘썰렁’
- 7한덕수 “이기기 위해 김덕수·홍덕수·안덕수·나덕수 될 것”
- 8이재명 10대 공약 발표…1호 공약은 ‘경제강국’
- 9신공항 적기 개항에 부울경 발전 사활 걸렸다
- 1060대 대리기사 몰던 테슬라 골목길서 '돌진'…2명 다치고 차량 7대 파손

[책이 있는 풍경] 몸이 시키는 대로
- 가
두부/박완서

나는 언제부턴지 모르게 소설을 잘 읽지 않게 되었다. 창작된 이야기는 흥미롭게 몰입되다가도 작가의 의도와 부딪히게 되면 꿈에서 깨어나듯 현실로 돌아오고 만다.
박완서 선생의 소설도 읽은 적이 없었는데 단편 ‘마른 꽃’을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당신의 책을 찾게 되었다. ‘마른 꽃’은 환갑이 지난 여자의 연애담을 내용으로 한 단편인데 다 읽고 나서 소설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사실적으로 와 닿았는지 놀라웠다.
시대적인 정서에는 반하지만, 꽃으로 비유된 여자가 나이가 든 자신의 나신(裸身)을 보게 되면서 좌절하는 대목에 탄복하면서 공감하게 되었다. 늙지 않는 마음과 예순 해를 넘긴 몸, 연인이 생겨 감정이 무르익어가는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극적으로 대치하게 되면서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떠올랐다.
감성은 늙지 않아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몸이야 어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몸 상태가 수습이 어려운 고장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 따위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알게 된다. 마음대로 쓴 글이 아닌 몸이 시키는 대로 쓴 것 같은 박완서 선생의 산문집 ‘두부’에는 나이 든 사람의 보통 인생의 득도일갈(得道一喝) 같은 글이 있다.
‘나도 내 몸하고 저렇게 소리도 없이 사뿐히, 뒤돌아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박완서 산문집 〈두부〉 ‘노년’ 중-

김정관
건축사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