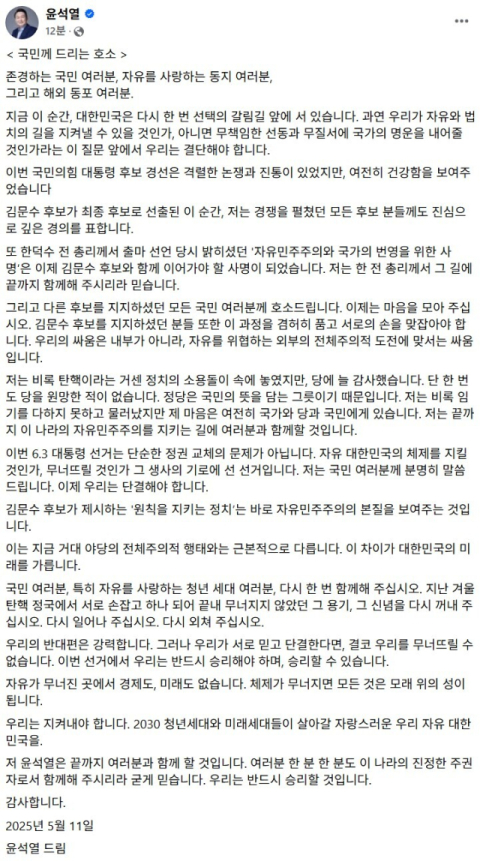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05.13 (화)- 1마을버스 하차하던 20대, 바퀴에 깔려 숨져…버스 기사 입건
- 2"바다 야구장, 북항의 랜드마크로"…부산 동구, 대선 공약 1호 과제 추진
- 3방파제 빠진 아내 구하려다 남편도 추락… 60대 부부 40분 만에 구조
- 440대 연인 살해 뒤…"내가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20대 남성
- 5'후보 회복' 김문수 "즉시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한덕수 함께 해달라"
- 6현역 17명 중 4명만 참석… 부산 국힘 선대위 출범식 ‘썰렁’
- 7이재명 10대 공약 발표…1호 공약은 ‘경제강국’
- 8한덕수 “이기기 위해 김덕수·홍덕수·안덕수·나덕수 될 것”
- 9신공항 적기 개항에 부울경 발전 사활 걸렸다
- 1060대 대리기사 몰던 테슬라 골목길서 '돌진'…2명 다치고 차량 7대 파손

[밀물썰물] 우리 기상청
- 가

예전에는 기상청을 관상대라고 불렀다. 조선 시대에 천문·지리·책력·측후 등을 관장하던 기관인 ‘관상감(觀象監)’에서 유래한 이름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천체 현상을 관찰해 백성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관상감의 최고 책임자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영의정이 겸임했다. 1982년에 중앙기상대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사람들이 관상(觀相·얼굴을 보고 운명을 판단하는 일)과 헷갈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0년에 지금의 기상청으로 개편되었다. 기상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는 오보로 판명되었다. 과거에도 예보가 틀려 ‘양치기 기상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해에는 예보가 자주 빗나가 오보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급기야 ‘기상 망명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우리 기상청 예보 대신 정확도가 높다고 소문난 노르웨이, 체코, 영국 등 유럽 기상 사이트를 찾는 이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올해 유독 잦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두고도 우리 기상청과 외국과의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기상청은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스치듯 지나갈 것으로 봤고, 미국과 일본은 부산에 상륙하겠다고 예측했다. 전체적인 경로로 보면 기상청의 분석이 가장 정확했다. 멀리 떨어진 외국 기상 사이트가 기상청보다 정확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중앙관상대 출신으로 방송 기상캐스터의 시초가 된 김동완 통보관이라는 분이 있다. 업계의 전설이 된 그 역시 일기예보가 틀려 하루에도 수십 통씩 항의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입맛이 없어 점심을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은 9번 적중한 경우는 잊어버리고 1번 틀린 경우만 기억한다. 일기예보에 좀 더 성숙한 태도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보가 나올 때마다 예보관을 교체해 유능한 인재가 머물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잦은 태풍은 기상이변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탓에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날씨 예보 정확도가 낮아진 원인을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가을 태풍이 또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걱정이다. 11호가 되는 다음 태풍이 생기면 북한이 내놓은 ‘노을’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영화 ‘친구’의 대사를 노을에게 들려주고 싶다.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박종호 수석논설위원 nleader@busan.com
박종호 기자 nleader@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