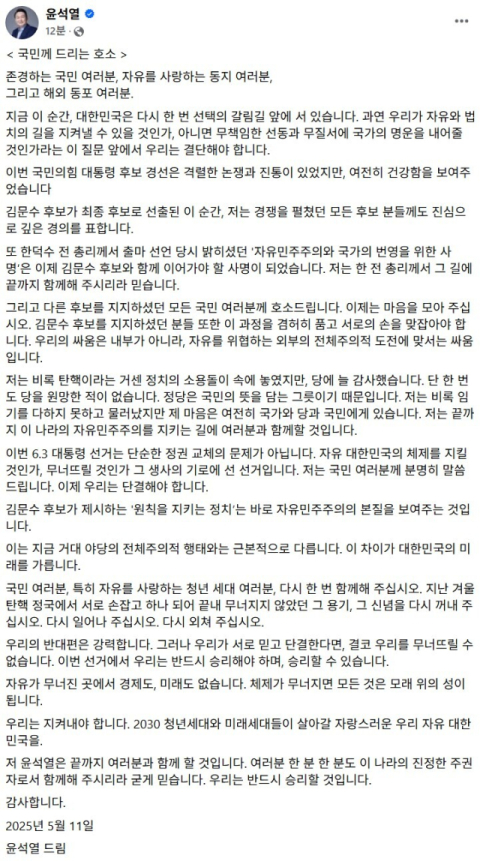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05.12 (월)- 1마을버스 하차하던 20대, 바퀴에 깔려 숨져…버스 기사 입건
- 2"바다 야구장, 북항의 랜드마크로"…부산 동구, 대선 공약 1호 과제 추진
- 3[단독] 부산콘서트홀 조성진 공연, 부산시장도 티켓 못구했다
- 4방파제 빠진 아내 구하려다 남편도 추락… 60대 부부 40분 만에 구조
- 540대 연인 살해 뒤…"내가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20대 남성
- 6[속보] 한덕수, 오늘 오전 9시30분 입장 발표…"국민·당원께 마지막 인사"
- 7'후보 회복' 김문수 "즉시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한덕수 함께 해달라"
- 8현역 17명 중 4명만 참석… 부산 국힘 선대위 출범식 ‘썰렁’
- 9한덕수 “이기기 위해 김덕수·홍덕수·안덕수·나덕수 될 것”
- 10이재명 10대 공약 발표…1호 공약은 ‘경제강국’

[생활의 발견] 태풍(颱風)이야기
- 가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지는 9월이다.
가을이 시작되는 느낌을 받기 무섭게,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지나갔고, 뒤이어 며칠간 폭우가 쏟아져 부산·경남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처럼 유독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한 강한 태풍이 찾아와 크고 작은 피해가 발행한다.
이때마다 언론에서는 다가오는 태풍의 규모와 함께 ‘사라’, ‘셀마’, ‘루사’, ‘매미’ 등 우리나라에 역대급 피해를 준 태풍 사례를 함께 소개하곤 한다.
이런 태풍의 작명은 1953년 호주에서 시작되었다. 호주의 기상예보관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태풍에 붙이기 시작했고, 이후 미국에서도 예보관들은 헤어진 애인의 이름이나, 심술궂은 아내 이름을 태풍의 이름으로 붙였다고 한다. 아마도 쏟아지는 비와 세찬 바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공포스러운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 기록에서는 어떨까?
옛 기록을 보면, ‘태풍’ 대신에 ‘대풍우(大風雨: 큰 바람과 비)’, ‘영풍폭우(獰風暴雨: 거센 바람과 거친 비)’, ‘구풍(颶風: 회오리치는 세찬 바람)’ 등으로 바람과 폭풍우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기록만 700여건이 넘는다. 실록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자.
태종 13년 10월 18일
제주(濟州)의 병선 1척이 태풍에 침몰하였는데, 경차관(敬差官)을 호송하던 배였다. 왜구를 만나 서로 싸우다가 태풍으로 침몰하여 빠져 죽은 자가 6인이었다.
효종 7년 9월 7일
옛날부터 어느 시대인들 재해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천둥과 우박이 하늘을 뒤흔들어 죽거나 다친 이가 1백여 명이고 태풍(구풍)이 바다를 흔들어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천여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공묘(孔廟)가 무너지고 위패가 손상되기까지 하였는데, 이 보고가 한번 알려지자 듣는 자들이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도 태풍에 의한 풍랑과 해일은 여전히 무서운 존재지만, 예보 없이 갑작스러운 순간에 자연재해를 온전히 겪은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더욱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은 국립해양박물관 3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한권의 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죽천이공행적록, 竹泉李公行蹟錄>,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09호
<죽천이공행적록, 竹泉李公行蹟錄>,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09호
<죽천이공행적록 竹泉李公行蹟錄,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09호>은 바닷길로 떠난 중국 명나라 사행길 기록을 담은 책으로 당시 태풍으로 인한 풍랑과 해일의 공포,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은 1624년 인조의 책봉을 위해 주청사(奏請使, 중국에 정치적 또는 외교 업무 등으로 임시로 파견된 사신)로 명나라에 다녀온 이덕형(李德泂,1566~1645)의 사행을 기록한 책으로 한글로 쓴 필사본이다. 이 책은 1624년 6월부터 10월까지 해로 사행의 항해 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바다의 낯선 환경에 처한 인물의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신단 일행은 여섯 척의 배와 사백여 명의 격군이 동원된 대규모 사행이었으며, 평안도 선사포를 시작으로 중국 산동성 등주(登州)로 향하는 약 3,760리(=1,477km)의 바닷길을 따라 항해하였다.
 <명나라로 가는 길 航海朝天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덕형 일행의 사행길을 담은 그림 모음집으로, 사행을 떠나는 첫 장면이다. 훗날 해로 사행을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행길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는 이덕형의 글이 말미에 적혀있다.
<명나라로 가는 길 航海朝天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덕형 일행의 사행길을 담은 그림 모음집으로, 사행을 떠나는 첫 장면이다. 훗날 해로 사행을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행길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는 이덕형의 글이 말미에 적혀있다.
머나먼 이국땅으로 떠나는 사절단에게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은 예측할 수 없는 태풍과 큰 파도를 만나 생기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마주하는 것이다.
특히 1620년~1621년 타국으로 떠난 사신들의 연이은 조난으로 전원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사신으로 가게 된 이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사행길을 기피했다고 한다. 1624년 사행을 떠나게 된 이덕형 일행 역시, 바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나라를 위한 사명감과 숭고한 업적을 위해 사행길을 떠났을 것이다.
“회오리바람이 급히 일어나 산 같은 물결이 하늘에 닿으니.... 배가 물결에 휩쓸려 백 척 물결에 올라갔다가 다시 만 길 못에 떨어지니 어찌할 방책이 없어 하늘에 축원할 뿐이라. 밤이 깊은 후 바람의 기세 더욱 심하여 배 무수히 출몰함에 지탱하지 못하네. 부사가 탄 배가 가장 험한 곳에 정박해 배 밑 널빤지가 부러져 바닷물이 솟아 역류하여 배안으로 들어오니 사람들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부사가 복건을 쓰고 심의를 입고 뱃머리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축문을 지어 깨끗한 비단에 싸 바다에 넣고 군관과 노졸로 하여금 옷을 벗어 틈을 막고 또 막게 하더라.”
그들에게 갑자기 닥친 태풍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부서진 배의 구멍을 옷으로 막고,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에서 여러 번 풍랑으로 배가 부서질 위기를 겪고, 그 두려움에 수차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항해 중 용오름 같은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을 기록하는 행위들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 홀연 구름이 하늘을 막고, 비가 잠깐 내리더니 무엇인가 또렷이 보이는데 한끝은 하늘에 다하고 한끝은 바다에 드리웠으니 몸 크기 두어 아름이 되고, 아래는 점점 작아 끝이 극히 가느다라니 몇 길이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허리 위는 오색구름 속에 은은하게 비쳐 자세히 볼 길이 없고, 다만 누런 광채 공중의 밝게 빛나고 금 같은 비늘이 상하에 번득이니 그 기이한 형상을 말로 형용치 못하노라. 뱃사공은 황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나라로 가는 길 航海朝天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용오름을 표현한 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명나라로 가는 길 航海朝天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용오름을 표현한 장면을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한글 사행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죽천이공행적록>은 사행에서 일어난 사실들의 기록 뿐 아니라, 당시 해로 사행을 하며 겪은 바다와 대자연의 위대함과 두려움을 가감 없이 표현하였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나약하고 작은 존재였음을, 그리고, 몇 백 년이 지나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자연은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거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권유리 객원기자 yulee@busan.com/ 국립해양박물관 문헌정보팀장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