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종이신문이 뭐냐고 묻는 당신에게
- 가
이재희 디지털미디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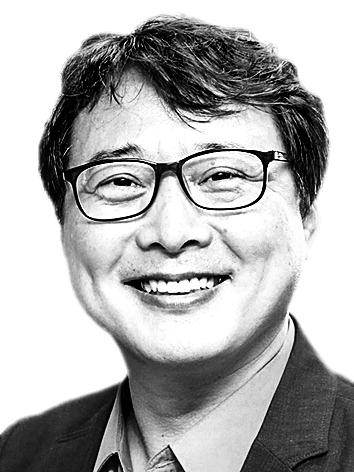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 정확하게는 액정이 깨졌다. 스마트폰의 생명은 사실 액정. 깨진 유리를 두고 터치나 스크롤을 할 수 없으니 고쳐야 했다. 수리비가 배나 비싼 정품 수리소 말고 대학가 인근 사설 수리소에 갔다. 선택할 여지가 없다. “30분쯤 걸립니다. 앉아서 기다리셔도 되고, 나가서 다른 일을 보고 오셔도 됩니다.” 딱히 할 일이 없었기에 자리에 앉았다. 손에 무엇이 없으니 허전함이 몰려왔다. 뭐라도 하자고 두리번거렸다. 신문이 눈에 띄었다. 익숙한 신문 <부산일보>와 서울 지역에서 발행되는 재경지 한 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신문을 구독하다니.’ 너무 반가웠다. “사장님 신문을 보시네요. 신기합니다.” 반갑고 놀라운 느낌이 그대로 말에 담겼다. “손님이 기다리시기에 심심할까 봐 신문을 둡니다. 아무래도 수리하는 동안 뭐라도 하셔야 하거든요.”
디지털 뉴스가 지배하는 뉴스 시장
스마트폰 멈추자 반짝 돋보인 신문
불과 20여 년 사이 구독률 10%대
향수 자극하며 구독 유도해도 역부족
수난 오래됐지만 사망선고 아직 일러
독자가 사랑해 준다면 끝까지 갈 터
한국언론재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종이신문 구독률은 급전직하했다. 종이신문 구독률은 1993년 87.8%였는데 2017년엔 16.7%까지 떨어졌다. 이탈한 독자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쏠렸다. 물론 종이 신문 구독률이 떨어졌다고 뉴스가 줄지는 않았다. 뉴스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 포털과 모바일에서 말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대체 언론’이 이미 대세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종이신문 읽는 참 재미를 모르거나 저어하는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종이신문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매우)중요하다. 제시하는 근거를 읽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선 신문 읽기 습관을 들이면 매우 중요한 일과가 된다. 당신의 아침이 교양으로 가득 찬다. 무엇보다 쾌변을 유도하는 데도 유용하다. 또한 신문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신문이 제시하는 의제 설정은 복잡다단한 세상의 뉴스 속에서 당신의 사고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도 미심쩍다면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종이 신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포기한 상태라도 기사회생하는 희망 이야기다. 최근 <신문협회보>에 ‘종이신문을 사랑하는 MZ세대’라는 기사가 났다. 진예정 BTN라디오 PD가 쓴 기고문 기사이다. MZ세대인 듯한 진 PD는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랐지만, 인간만큼은 디지털일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종이신문을 읽는다. 스마트폰 스크롤을 슥슥 내리며 기사를 읽고 있으면 내가 정보를 삼켰는지 그저 흘려보냈는지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물리적 형태를 가진 종이신문에 밑줄을 그어 가며 기사를 읽으면 ‘콘텐츠를 씹어 넘긴다’는 느낌이 든다.” 이 글은 (종이)신문 종사자가 쾌재를 부를 내용이다. (종이)신문협회보의 머리기사로 실렸으니 내용이 좋은 것은 둘째다. 딱 신문 종사자의 입맛에 맞는 기사다. 물론 머지않은 미래에 종이신문의 종말을 예고한 <부산일보> 디지털에디터가 보면 실소할 내용이지만 말이다. 아이러니는 진 PD가 종이신문의 장점을 열거하며 매일 밑줄 그어 공유하는 이 기사는 디지털 세상인 한 SNS에서만 볼 수 있다.
종이신문의 수난사는 근래 스마트폰이라는 침입자(?)로 인해 비롯됐다고 혹 오해할 독자를 위해 그렇지 않다고 그나마 위안을 드리고 싶다. 인터넷을 뒤져 언론 관련 논문에서 찾은 자료다. 특별한 주장(학설)이 아니라 팩트이기에 출처는 생략한다. 우선 1920년 등장한 라디오 시대에 신문은 1차 위기를 겪었다. 심지어 라디오 방송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단다. 1945년 라디오가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특종보도하자 신문의 속보성도 라디오에 뺏겼다. 그렇게 잘나가던 라디오는 1960년대 텔레비전 뉴스가 위세를 떨치며 신문과 동병상련 신세가 됐다. 영상은 효과적인 뉴스 전달자였다. 방송 뉴스에 놀란 재경지 일부가 석간에서 조간으로 전환한 이유도 텔레비전 뉴스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부분 하루 전 뉴스인 신문과 달리 방송 뉴스는 당일 뉴스라 경쟁이 될 턱이 없었다. 신문은 자구책을 세웠다. 아무리 영상이 자극적이라 하더라도 방송 뉴스는 휘발성이 강하다. 신문은 분석과 심층 보도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1980년대 탐사보도 전성시대는 방송 뉴스와의 경쟁 덕분이라고 한다.
1998년 야후코리아의 뉴스속보와 2000년 5월 네이버 뉴스 서비스, 2003년 미디어다음과 네이트뉴스 등 인터넷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시작했다. 포털에서 공짜 뉴스를 보는 독자는 신문을 버렸다. 현재는 포털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쟁쟁한 SNS가 뉴스 아닌 뉴스를 지배한다. 따져 보면 종이신문의 수난사는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숨이 붙어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디지털 온리’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종이신문을 잘 만든다.
jaehe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