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는 부산 현대사·부산 문화의 분수령”
- 가
경성대 박훈하 교수‘부산에 살지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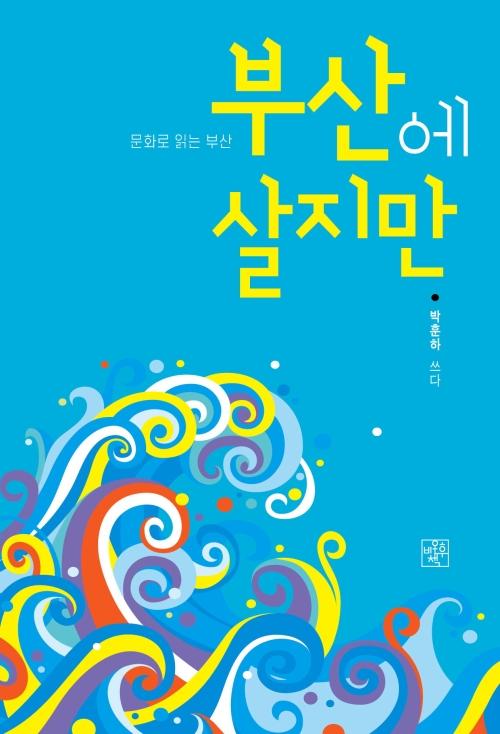
박훈하 경성대 교수가 낸 <부산에 살지만>(비온후)은 평이한 서술에 나름의 관점을 취한 부산 문화론이자 부산 소개서다. 박 교수가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진행한 ‘문화로 읽는 부산’을 책으로 묶은 거다.
12강좌 구성에 부산의 바다, 시장, 언어, 음식, 상징물, 야구, 등산, 그리고 경계문화, 근대화 과정과 지리적 확장, 공론장과 시민사회, 로컬문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뤘다. 부산의 상징물로 부산박물관, 부산타워, 광안대교뿐 아니라 낙동강하구둑건립기념탑을 불러내 문화적 해석을 가한 것은 새롭다. 산이 많은 부산에서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는 이유를 초고령화 도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안착·운신할 마을·동네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으로 보는 것도 시사적이다.
100년 정도 짧은 도시 역사 속
개방성·혼종성 특징 자리잡아
주체성 근거 공동체 회복 필요
박 교수는 부산의 문화적 특징을 ‘개방성’과 ‘혼종성’으로 압축하고, 이를 100년이라는 짧은 도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본다. 따지고 보면 ‘부산’은 100년 안짝의 도시라는 말이 된다. 여하튼 100년 역사의 도시 부산은 낯설고 이질적인 것의 훌륭한 융합으로 도시적 활력을 만드는 ‘혼종성’과 ‘개방성’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는 거다. 부산은 해방 때 28만에서 거의 10년마다 100만 명씩 인구가 늘어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운 희귀한 도시라는 데서 그 문화적 특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단다. 그 속에서 부산의 야구 열광도 생겨나고, 기존 구포·동래시장과 더불어 자갈치·평화·국제시장이 형성되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시기와 맞물려 어묵 돼지국밥 밀면 조방낙지 문현곱창 활어회 등에 이르는 부산 음식 문화가 직조됐다는 거다.
박 교수는 1980년대를 부산 현대사와 부산 문화의 분수령으로 본다. 그 시기 이후 현재까지 40년 동안 부산은 인구 변동이 그리 크지 않아 주민들의 토착화가 진행됐다는 거다. 우려스러운 것은 개방성과 혼종성의 문화가 폐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남이가’하는 ‘복국집 정치 스캔들’도 있었고, 제2도시의 허울적 수사에 매몰됐다가 갑자기 일극 위주의 ‘해운대 지상주의’로만 내닫고 있으며, ‘부산 싸나이’라는 마초적 퇴행 현상도 보인다는 거다. 일련의 ‘폐쇄적 위축’은 토대 차원에서 부산 경제의 실추와 맞물린다.
특히 공론장 위축은 부산 시민의 주체성 위기를 반영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생각이다.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던 부산지역 대학교들의 운동장은 모두 ‘산’으로 올라갔고, 이전의 부산역 광장 같은 도시의 공론 광장도 다른 것들로 채워져 없어졌으며, 다른 도시 광장에서 진행된 촛불 시위는 부산에서는 광장이 없어 서면 골목 혹은 대로에서 열렸다. 부산의 언론 상황도 뉴스 기획력과 자체 편성 비율에서 ‘부산 시민의 정체성’을 만들기에는 아쉽게도 크게 역부족이라고 한다.
박 교수는 부산 시민의 주체성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국가의 이익 혹은 현 정권의 이익에 반할지라도 상식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판단될 때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시민이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부산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융합할 수 있는 사회와 로컬문화’를 능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산이 이미 ‘식민지시대의 부끄러운 얼굴, 해방과 전쟁이 가져온 혼란의 얼굴, 경제성장기 때의 촌스러운 얼굴, 그리고 지금 인천보다 못하다고 불평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얼굴 등등’을 가진 혼종성과 개방성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간된 김형균의 <부산정신 부산기질>과 함께 박 교수의 <부산에 살지만>은 가벼운 터치로 근년 부산 문화론의 목록을 더하는 책이다.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