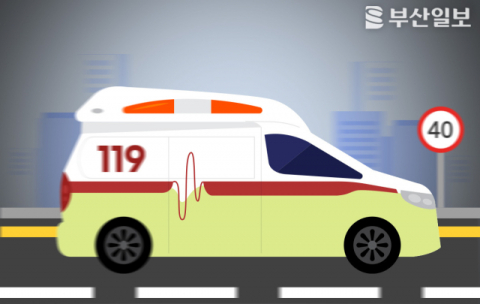가장 많이 본 뉴스
2025.05.05 (월)- 1차에서 번개탄 피웠다가 빌라 전체가…1명 숨지고 차량 8대 불타
- 2하루만에 확 떨어진 원달러 환율…이유는?
- 3에어부산 비행기 조류 충돌…긴급 회항
- 4해운대해수욕장 밝힐 초대형 전광판…다음 달 점등식
- 5대법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중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 6한덕수, 대선 출마…“임기 단축 개헌, 3년차에 총·대선 동시 실시”
- 7어린이날 앞둔 부산서 익명의 기부자 나타나… 이번이 12번째
- 8김문수 "논란 많은 사전투표제 폐지…국회의원 불체포도 없앤다"
- 9군 초소 담벼락 들이받은 1t 트럭…운전자 숨진 채 발견
- 10‘무단결석 1개월' 의대생 무더기 제적되나… 인제대 557명 포함

[유인권의 핵인싸] 대성당의 시대
- 가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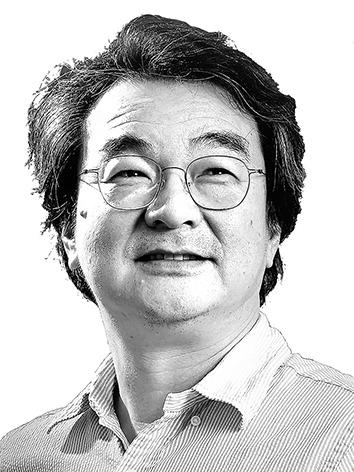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막이 오르면 한 시인이 무대에 올라 ‘천년의 대성당 시대와 필연적인 몰락’을 노래한다. 작게 보면 15세기 말 파리, 한 집시 여인(에스메랄다)을 두고, 그 여인을 지배하려는 부주교(프롤로)와 그의 보살핌으로 자라난 꼽추(콰지모도) 사이에 벌어지는 치정 이야기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대성당 시대의 추악한 권위와 이에 대별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다. 대성당 권위의 추락은 역설적으로 대성당 시대 천년으로 인한 필연적 귀결이었다.
숭배와 절대화는 그 자체로 모순
권위에 부여된 본 취지 되새겨야
법도 인권·존엄성 해쳐선 안 돼
신의 명령에 의해 모든 것이 생겨났음은 물론 해를 멈추게도 하고 달과 별이 저 허공에 떠서 빛나게 하는 것도 모두 신의 의지였다. 끔찍한 외모의 꼽추와 부랑자들이 어울려 다니며 신심을 어지럽히는 것은 추방돼야 마땅한 일들이었다. 자신을 속일지언정 거룩한 신의 섭리를 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항하는 일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우주는 신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무대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것은 신이 지정한 진리였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 낸 망원경으로 금성의 모양이 달처럼 변하는 것과, 목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한 갈릴레이는 얼마나 당황했을 것인가. 우리가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우리 지구도 다른 행성들과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일은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었을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조차 사제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자연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대성당의 시대가 몰락한 것은 결국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사제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신심이 열렬하던 사제들까지 타락하게 한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권위에 대한 ‘숭배’와 ‘절대화’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정작 그만한 권위가 부여된 근본적인 취지와 동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주객의 전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유대 사제들의 율법 절대화에 죽기까지 저항한 예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단죄 심지어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은 교회가 있었다.
절대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물리학 법칙도 예외가 아니다. 과학 자체가 철석같이 믿던 진리에 대한 도전으로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상을 법칙에 맞추려는 일은 빈번하다.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도 어떤 ‘법칙’의 권위에 의존하여 그 현상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난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팽창하는 우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시작’이 있어야 하는 ‘비상식적’인 결론을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팽창하지 않는 우주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주항’이라고 하는 특별한 가설까지 도입했다. 자연이 물리학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물리학 법칙이 자연을 기술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 너무나도 자명한 일을 놓고도 우리는 ‘법칙’이라는 기존의 권위에 집착하기에 십상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진리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지만, ‘이것만이 진리’라는 절대적인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비진리’임이 명백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의하여 박 대통령은 파면됐으며 모든 시빗거리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인용됐을 때 나는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권위로서 헌법재판소가 있음에 안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권위가 악용된다면 어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대법조’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었음을 이제야 뒤늦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온 구성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큰 어른들이 계셨다. 집안은 물론 종교계와 언론계, 학계 등 도처에 존경받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대개의 사회가 그렇듯이,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하면서 더 이상 그런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발전의 방향인지는 감히 예단할 수 없으나, 권위주의가 추락하는 가운데 대법조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른바 ‘법과 원칙’이 도처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대성당의 시대가 그러했듯 그것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와 동기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특정인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나, 혹시라도 정작 그것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대의가 위협받게 된다면 잘못됐음이 분명하다. 무엇이든 독점되고 절대화할수록 몰락한 대성당의 전철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