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광의 지발도네(Zibaldone)] '파친코'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 가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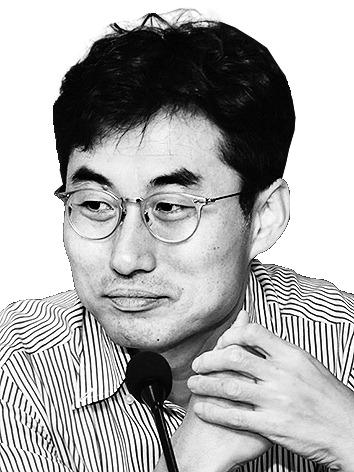
애플 TV에서 제작한 드라마 ‘파친코’가 비평과 흥행 모두에서 성공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시청자들을 배려한 듯, 드라마는 시대 배경을 세세하게 풀어냄으로써 이산의 문제를 완성도 높게 그려 내었다.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보는 것 같은 구성은 애플 TV가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 게다가 드라마에 주연으로 참여한 한국 배우들 역시 미국 현지 매체와 활발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 과거와 사뭇 다른 확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얼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오징어 게임’과 ‘파친코’를 연결해 “한국 서사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기존의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파친코’는 ‘오징어 게임’과 여러 모로 결이 다른 작품이고, 막연한 판단과 달리 소재는 한국이긴 하지만 그 드라마가 얹혀 있는 조건은 오히려 미국의 상황에 들어맞는다. ‘파친코’에 대한 관심은 정확히 미국에서 ‘인종’의 정체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독자적인 정체성 집단으로 규정한 선구적 연구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재직하다가 2009년에 세상을 떠난 로널드 다카키 교수이다. 1989년에 그가 출간한 <다른 해안에서 온 이방인>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국 서사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 입증
‘인종’으로서 아시아인의 존재감 넘어
개별 민족에 대한 다양한 시각 확산 신호탄
1998년에 출간한 개정판 서문에서 다카키 교수는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주는데, 초판의 성공 이후에 NBC 투데이쇼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인 제인 폴리와 나눈 대화가 그 내용이다. 폴리는 다카키 교수에게 “엘리스 아일랜드와 엔젤 아일랜드를 서로 비교해 줄 수 있느냐”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다카키 교수의 대답도 의미심장했다. 그는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던 E D 허쉬의 <문화적 문해력: 미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그 책이 나열한 목록에 엔젤 아일랜드가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엘리스 아일랜드와 엔젤 아일랜드는 둘 다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 머물던 장소였다. 엘리스 아일랜드가 유럽 이민자들이 들어온 곳이었다면, 엔젤 아일랜드는 중국 이민자들과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이 들어온 곳이었다. 그럼에도 허쉬의 책은 엔젤 아일랜드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카키의 문제제기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각성을 불러왔고 그 이후 다양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삶이 문학이나 영화를 통해 재현되었다. 에이미 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조이럭 클럽’처럼 중국계 미국인을 이민사의 관점에서 다룬 영화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추세는 계속 이어져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2018년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마침내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감독과 배우가 모두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 배우들로 채워진 이 영화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라는 자기 정체성을 미국의 주류 문화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신호탄이었다. 큐레이터이자 감독인 아서 동은 2019년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서 비로소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인으로 제대로 그려졌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파친코’ 역시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처럼 한국계 감독과 현지 배우들이 제작의 핵심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분명 ‘파친코’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작품으로 회자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의를 넘어서서 또한 ‘파친코’는 아시아계 미국 이민의 문제를 민족주의의 시선과 다르게 인종의 문제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보여 준다. 2019년에 듀크대 출판부가 출간한 <인종적 멜랑콜리아, 인종적 해리>라는 책을 보면, 두 아시아계 저자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심리상태를 임상 경험에 근거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아시아계 미국인을 하나의 인종으로 전제하면서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 억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문화나 학술에서 자연스럽게 인종으로 그려지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모습은 분명 지리학적인 아시아에서 살아가는 아시아인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 왜냐하면 현실의 아시아 자체는 하나의 인종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중동인을 혐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연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종적 정체성은 전후에 민족국가로 잘게 쪼개진 아시아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음을 ‘파친코’가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