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 가
13) 팔려가는 배의 마지막 항해
열흘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에 꼬여
일본서 홍콩까지 헌 배 팔러 가다
도중에 풍랑 맞아 죽음 문턱 경험
갖은 고생 끝에 한 달 걸려서 귀국
 선령 30년이 넘는 낡은 배를 홍콩까지 몰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기관장 복장을 하고 있는 다소 젊은 시절 필자 모습. 김종찬 제공
선령 30년이 넘는 낡은 배를 홍콩까지 몰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기관장 복장을 하고 있는 다소 젊은 시절 필자 모습. 김종찬 제공
해외 송출선인 카틀레야호에서 1년 동안의 장기 근무를 마치고 하선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홍호이호에 승선해 달라는 선원과장의 전화를 받았다. 홍호이호는 1만 6000톤급 벌크선으로 선령 30년이 넘는 헌털뱅이 배였다. 하도 말썽 많기로 소문난 배라 이 회사에 오래 근무한 선원들은 누구나 홍호이호에 승선하기를 꺼려했다. 선실 통로에서 지나가다 어깨만 부딪쳐도 서로 눈알을 부라리며 노려볼 정도로 선원들의 분위기가 나쁘다는 배였다. 이제 막 무릎걸음으로 기기 시작하는 첫아이의 재롱에 정이 들던 나도 승선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마음 약한 나는 카틀레야호에서 같이 근무했던 박 선장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다. “기관장, 홍콩 매선장(賣船場)까지 배만 몰아다 주면 끝나니까 열흘이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어요. 휴가 중에 홍콩 구경 한 번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갑시다. 잠시 고생하고 오면 다음 승선 시에는 회사에서 제일 성능 좋은 배를 골라 태워 줄 거요.”
 홍콩까지 몰아달라는 배는 1만 6000톤급 벌크선이었다. 사진은 3만 1000톤급 벌크선 모습. 해수부 제공
홍콩까지 몰아달라는 배는 1만 6000톤급 벌크선이었다. 사진은 3만 1000톤급 벌크선 모습. 해수부 제공
김해발 후쿠오카행 KAL기를 탔다. 후쿠오카에서 신칸센 히카리(光)호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갔다. 시모노세키 선착장에서 통선을 타고 한 시간 정도 달려가니 건현에 벌겋게 녹물이 흘러내리는 홍호이호가 유령선처럼 덩그렇게 떠 있었다. 연돌에서는 연소 불량의 검은 연기를 계속해서 내뿜고. 삐거덕거리는 갱웨이를 타고 배에 올라가니 통로의 불빛마저 어둠침침해 더욱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기관실에 내려가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선미관이었다. 수밀 재(材)인 리그넘바이테(Lignumvitae)가 한도 이상으로 마모된 탓이었다. 그랜드 패킹 볼트를 더 죄면 누수량은 줄어들지만 마찰이 심해 열이 나서 더 죌 수가 없었다. 프로펠러 중간축도 진동이 심해 축받이 베어링(Plumber block)을 잡아주는 고정 볼트가 언제 부러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배를 몰고 다녔을까? 잘못 왔구나! 당장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일본에서 홍콩으로 가는 뱃길, 출항 3일째부터 풍랑을 만났다.’ 사진은 태풍 북상 중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높은 파도 모습. 부산일보 DB
‘일본에서 홍콩으로 가는 뱃길, 출항 3일째부터 풍랑을 만났다.’ 사진은 태풍 북상 중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높은 파도 모습. 부산일보 DB
일본 출항 후 이틀 동안은 바다가 잔잔했으나 사흘째부터 저기압이 홍호이호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배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 수는 가득 실었지만 화물이 하나도 없는 공선이라 선체는 작은 풍랑에도 맥을 추지 못했다. 파도가 정면에서 들이닥치며 선체를 헹가래 치듯 밀어 올리면 배는 배구공처럼 공중으로 치솟았다. 그럴 때마다 스크루는 수면 위에 드러나 헛바퀴를 돌며 자지러지듯 비명을 질렀다. 해수 흡입구인 시 체스트에도 공기가 혼입되어 냉각수 압력이 떨어져서 경보음이 울렸다. 그런 와중에 발전기까지 꼬르륵 꺼져버렸다. 선체의 심한 요동으로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찌꺼기가 일어나 필터가 꽉 막혀버렸던 것이다. 황천항해(荒天航海) 중에 전력까지 상실되어 버렸으니 배는 죽은 배(Dead Ship)가 되고 말았다. 선체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들까불리는데 희미한 비상등 아래서 막힌 연료유 필터를 청소하자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발전기를 다시 시동해 전원을 복구할 때까지 십 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지옥에서 몇 시간이나 보낸 기분이었다.
 ‘낡은 배는 거친 풍랑 속에 내동댕이쳐졌다. 선원들은 죽느냐 사느냐 반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했다.’ 사진은 부산 기장 바다에 큰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낡은 배는 거친 풍랑 속에 내동댕이쳐졌다. 선원들은 죽느냐 사느냐 반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했다.’ 사진은 부산 기장 바다에 큰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이번에는 브리지의 고물 레이더가 먹통이 돼 버렸다. 거친 바다 위에서 장님 신세가 됐는데 해님도 별님도 나타나지 않으니 천측(天測)도 할 수 없었다. 정상적인 항해였다면 벌써 홍콩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배가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니 추측항법(推測航法)으로 항해할 수밖에 없었다. 바람은 갑판 위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기세였다. 괴기한 휘파람 소리를 내며 선체를 뒤흔들었다. 해면은 비산하는 물방울로 허옇게 뒤덮였다. 선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마다 라이프 재킷을 챙겨 놓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다. 죽느냐 사느냐, 모두들 반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을 때 신을 찾는다고 했다. 죽음의 공포는 믿음 없는 사람도 기도하게 만들었다.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풍랑에 휩쓸리는 와중에 어딘지 모르는 수심 얕은 곳에 배는 닻을 내릴 수 있었다.’ 닻 모습. 연합뉴스
‘풍랑에 휩쓸리는 와중에 어딘지 모르는 수심 얕은 곳에 배는 닻을 내릴 수 있었다.’ 닻 모습. 연합뉴스
배가 어디쯤 있는지 선위는 모르지만 수심이 얕아 앵커는 내릴 수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닻은 놓았지만 배는 여전히 심하게 흔들렸다. 강한 바람에 앵커가 끌리지 않도록 밤새도록 주기관을 사용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의 기세가 한풀 수그러지고 멀리 수평선이 드러났다. 근처에 지나가는 배 한 척이 눈에 띄었다. VHF(초단파)로 위치를 물어보니 홍콩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했다. 앵커를 올리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해 질 무렵에 홍콩 외항 투묘지에 도착했다. 침실이고 통로고 온통 습기로 축축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났다고 감사하는 눈빛이었다.
 홍콩항 컨테이너부두 모습. 부산일보 DB
홍콩항 컨테이너부두 모습. 부산일보 DB
매선장(賣船場)으로 배를 옮겼다. 우시장 쇠말뚝에 매어 놓은 소처럼 팔려고 내놓은 배들이 20여 척이나 닻을 내리고 있었다. 개중에는 배가 언제 팔릴지 몰라 기름을 아끼느라 발전기도 돌리지 않고 밤이 되면 등불을 매달아 검은 실루엣만 드러낸 배도 있었다. 배를 매선장에 몰아다 놓으니 중국계 매수인(買受人)은 배가 도망가지 못하게 안전요원(Security man)만 보내놓고 나타나지 않았다. 뭔가 탈을 잡아 한 푼이라도 선가를 깎자는 속셈이었다. 자꾸만 인도(引渡) 일자가 늦어졌다. 청수도, 주·부식도 달랑달랑하는데. 나중에는 조리용 프로판 가스도 다 떨어져서 선미 갑판에 아궁이를 만들어 나무 조각으로 불을 떼서 밥을 해먹었다.
-이제 오늘 밤만 자면 내일은 새 선원들에게 인계를 해주고 집에 간다! 선원들은 기쁜 마음에 들떠 잠잘 생각도 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 앉아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새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던 황천항해의 악몽은 다 잊어버리고. 열흘이면 충분할 거라던 매선 항해는 꼭 한 달이 걸렸다. -끝- 글/ 김종찬 해양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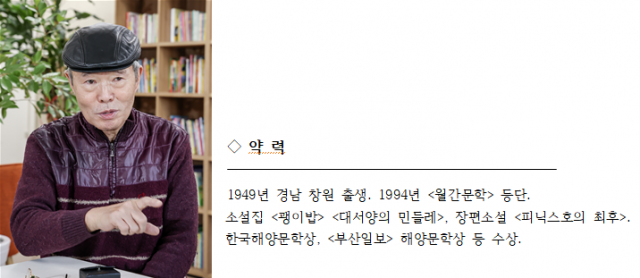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